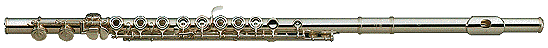
●바흐 /플루트 소나타집
바흐는 당대에 부각되기
시작한 플루트의 특성을 간파해 이전의 목가적 성격 외에 고귀하면서도 표현적인 성격을 불어넣었다. 앞에 작곡된 3곡은 플루트와 쳄발로용 곡이며,
뒤의 3곡은 여기에 저음악기가 첨가되는데, 이중 BWV 1031의 ‘시칠리아노’는
특히 전아한 아름다움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독주 플루트를 위한 BWV 1013은 무반주 바이올린 및 첼로곡집과 동일한 계열에 놓이는 작품으로
부레 무곡의 악장이 눈길을 끈다.

Sonata in E
flat major BWV 1031 전악장
2nd Mvmt
Siciliano
Tatiana
Nikolayeva 피아노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2번
제목은 관현악
모음곡으로 되어 있지만 제2번 모음곡은 현악기의 합주에 플루트의 독주가 협연되는 형식으로 사실상 플루트 협주곡에 가깝다. 5곡의 폴로네즈는 종종
팬플루트로 연주되어 라틴 아메리카의 민요로 오해받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마지막 곡인 바디네리는 4분의 2박자로 되어 수다떠는 듯한 기분을 전달해 주는, 발랄하고 빠른 곡으로 플루트의
화려한 성격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준다.
● 메르카단테/플루트 협주곡
E단조
19세기 중반 나폴리에서 활동한 작곡가 메르카단테는 당대에 주로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떨쳐 벨리니에 비견되기까지 했지만
오늘날 그의 작품은 이 플루트 협주곡 E단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잊혀졌다. 이 협주곡은 그가 청년기에 작곡한 습작으로 빈 고전파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는, 형식미에 충실한 작품이다. 마지막 악장의 경묘하고도 리드미컬한 주제는 특히 널리 알려져 있다.
2악장 Largo
● 쇼팽/‘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이 불과 14세 때 작곡한 소품으로 라디오의 배경음악에 많이 사용되어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곡이다. 로시니의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신데렐라)의 마지막 부분인 화려한 콜로라투라 아리아에서 주제를 따오고 있는데, 원곡도 역시 변주곡 형식으로 되어 있다. 쇼팽의
플루트 변주곡 역시 이 원곡의 변주를 상당부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플루트가 가진 화사한 정취를 마음껏 살려 주제를 전개시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모차르트가 네덜란드 출신의 플루트 주자 드 장의 의뢰를 받고 작곡한 두 곡의 플루트 협주곡 중 두번째 곡으로서, 이전에
작곡한 오보에 협주곡 C장조를 조옮김하여 개작한 곡이지만 원곡인 오보에 협주곡보다 훨씬 널리 연주되고 있다. 조성이 말해주듯 약동하는 활기로
넘치는 곡으로서, 특히 3악장의 장식적인 제1주제는 선율선이 예외적으로 길면서도
어느 한 군데 손댈 수 없는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
3rd
Mov. Allegro
●도플러/‘헝가리 전원 환상곡’
도플러는
19세기 후반의 플루티스트로 헝가리 태생이지만 후에 빈으로 진출하여 궁정가극장의 플루트 주자와 발레 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그의 대표작인
‘헝가리 전원 환상곡’은 그가 유년기부터 접했던 헝가리 고유의 민요 선율을 풍성히 사용해 동양적인 색채를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놀랄 만큼
극동 민요의 세계를 닮아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장식음이 풍부한 앞부분과 새기는 듯 빠른 리듬의 뒷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악장
● 비제/‘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중
미뉴에트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을 플루트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중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미뉴에트는 플루트 레퍼토리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그런데 정작 이 ‘미뉴에트는 원작의 ‘아를르의 여인’에는 들어 있지 않은 곡으로 비제의 사후 그의
다른 작품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중에서 가져온 것이다. 궁정적 향기와 여성적인 단아함을 갖춘 아름다운 소품으로 악기의 낭만적인 맛을 한껏
살린 명작이다.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집
비발디의 작품에는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해 형식의 엄정함에서 벗어나 독특한 감성의 발현과 개성적인 표현을 중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며, 이는 특히 플루트 협주곡에
있어서 더더욱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번 D장조 ‘붉은 방울새’ 서두의 경쾌한
상행음형은 가장 유명하다. 한편, 2번 G단조 ‘밤’은 6개 악장으로 된 기괴한 곡으로 불안 속을 달려가는 듯한 마지막 악장이 시대를 넘어선
독특한 표현을 보인다.



 그러나 온도변화에 가장 민감한 악기이므로 수시로 음정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는 난점이 있다. 다른 관악기에 비해 플루트 주자에게 훨씬 정확한 귀가 요구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플루트는 3옥타브의 음역을 가지며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3-5도 정도 더 날 수도 있다. 가장 낮은 음역에서는 배음이 적기 때문에
다소 억세며 거칠고 무디게 들린다. 그러나 웅대하고 시적이며 애조를 띠는 것이 이 음역이 지니는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저음역의 소리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하게 되면 음색적으로 섞여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악기와 중복되지 않는 선율을 연주한다.
그러나 온도변화에 가장 민감한 악기이므로 수시로 음정이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는 난점이 있다. 다른 관악기에 비해 플루트 주자에게 훨씬 정확한 귀가 요구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플루트는 3옥타브의 음역을 가지며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3-5도 정도 더 날 수도 있다. 가장 낮은 음역에서는 배음이 적기 때문에
다소 억세며 거칠고 무디게 들린다. 그러나 웅대하고 시적이며 애조를 띠는 것이 이 음역이 지니는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저음역의 소리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하게 되면 음색적으로 섞여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악기와 중복되지 않는 선율을 연주한다. 그렇게 볼 때 뵘
이전의 플루트는 트릴이나 반음을 내는 장치가 부족해 표현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령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대까지만 해도 키를
눌러서 음을 내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플루트를 위한 음악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현재의 플루트로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면서 “모차르트는 음악을 일부러 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소를 머금기도
한다
그렇게 볼 때 뵘
이전의 플루트는 트릴이나 반음을 내는 장치가 부족해 표현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령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시대까지만 해도 키를
눌러서 음을 내는 장치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플루트를 위한 음악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현재의 플루트로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면서 “모차르트는 음악을 일부러 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소를 머금기도
한다